서문
로잔운동은 지난 50년 동안 선교 관련 문제에 변화를 불러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4년 서울-인천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2은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1에 동반하는 문서로써, 현대 선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는 로잔 신학위원회가 오늘날 세계 선교를 더욱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로 판단한 영역들을 반영하고 있다.3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서 만들어진 로잔 언약4 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동 사명을 다루는 내용으로 복음주의자들에게 역사적이며, 영감을 주는 문서였다. 이 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과 문화, 전도와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는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1989년 제2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마닐라 선언5은 로잔 언약의 토대를 기반으로 삼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재확인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6이 발표되었다. 이 서약은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 전체로 성경을 해석하는 선교적 관점을 통해 은혜로운 초대로 재정의했다. 즉, 대위임령을 선교의 중심 모티프로 설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CTC I-1)라고 선언하며, 선교를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강조했다.
서울 선언은 로잔운동의 신학적 핵심 신념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복음의 중심성 (제1부)과 성경에 신실하는 것(제2부)’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응한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 선언의 전문은 전달하고 있다.(서울 선언 전문)
이 짧은 글에서는 서울 선언의 몇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루며, 선교를 위한 신학적 신념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이 선언이 기여한 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대회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교적 응답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분명한 비전에 가져다주는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7
우리가 살아내며, 전하는 이야기로써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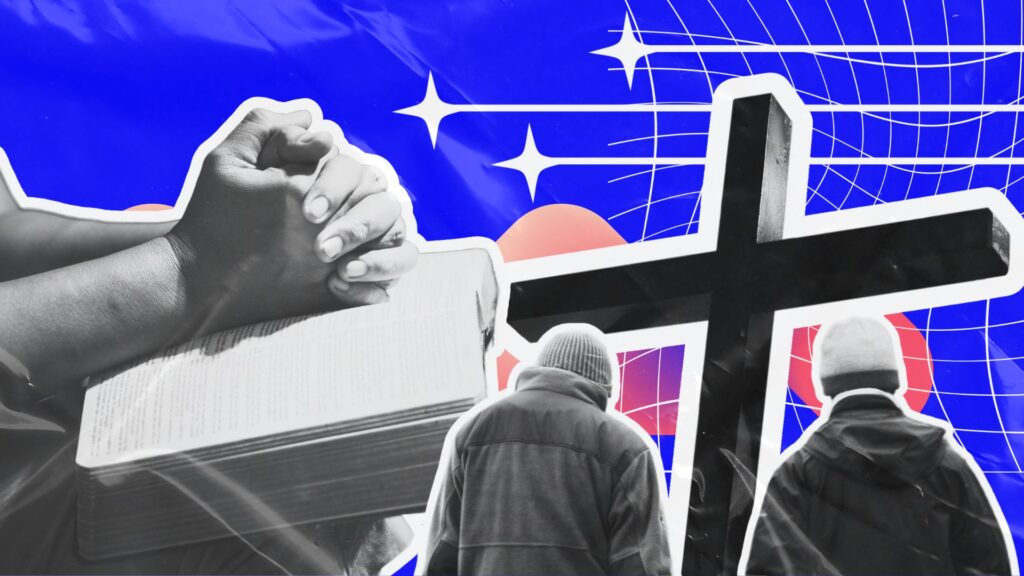
서울 선언에서 제시하는 일곱 가지 주제는 신학적, 선교적 혼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독교적 신념이 성경과 2천 년의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선포,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다.8
서울 선언은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선교의 필수 요소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 선언은 번영 신학, 실패하는 리더십, 동성애 등을 복음 증거의 걸림돌로 지적한다.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듯이, 개인 생활,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복음 선포와 분리될 수 없다.’(서울 선언 V-73) 성경을 먼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선교적 실천에 적용하는 서구적 접근법과 달리, 많은 다수 세계의 신학자는 실천적 삶 속에서 진리를 해석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전 로잔 문서들과 비교할 때 서울 선언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며, 그리고 ‘인간은 육체를 보완하는 영적 차원을 소유한 육체적, 영적 통합체’(서울 선언 IV-48)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탐구한다.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이 성(sexuality)과 이성 간 결혼에 가지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수 세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핵심적인 제자 훈련의 이슈이며, 협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 해석이 서로 다른 서구의 복음주의자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잔운동이 독특하게 기여하는 부분은 다양한 지도자 그룹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성경을 신실하게 읽도록”(서울 선언 II) 돕는 것이며, 이를 교회 밖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9 이러한 점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하나님의 세계 속 역사라는 성경적 내러티브를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선교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선교 운동으로써 로잔은 교리적 합의(이 역시 중요하지만)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지역에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며, 모든 교회와 분야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세우고,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공동 비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서구와 비서구 교회 모두에서 권력, 재정, 거룩함과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할 때, 서로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협업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전도와 사회적 실천

서울 선언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로잔운동이 지난 50년간 논의해 온 전도가 중심인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정의, 대화, 사회적 실천과 동등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주의 내부 논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우리가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고 명확히 한다. ‘세계복음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우선성을 확신하고, 따라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랑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낸다.’(케이프타운 서약 I-1)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입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제4차 로잔대회는 테이블 토크 형식의 참여 구조를 통해 세대, 성별,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입장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대위임령(마 22:37-40) 속에 대계명이 내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교회론과 성경 해석 방식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있어 당연히 중심적인 관심사였다. 선교가 직면한 도전은 복음과 동시에 세계의 위기를 어떻게 선교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오늘날 주요 글로벌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가운데,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놓여있을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언(눅 4장, 막 6:33)을 기준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대회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

우리 세계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환경적 위기로, 창조세계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생태적 파괴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둘째는 빈곤의 위기로, 권력과 부의 집중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샬롬(충만한 삶)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는 평화의 위기로,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쟁, 민족 간 갈등, 인종차별 문제를 정치적·이념적 분열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 세계 대회는 세상의 가장 가난한 이들과 복음을 가장 적게 접한 공동체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면 진정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선교의 종말론적 차원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탈출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창조세계가 변화를 경험하는 변혁의 계획을 찾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선교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창조세계의 치유와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특권적 사명이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선교 선포의 장애물이 되는 갈등 속 열방 공동체
서울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상호 간의 축복을 하는 관계로 화해하는 하나님의 목적’(서울 선언 VI-77)을 확인하며,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화해의 사명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동의 분쟁과 관련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국제적 인도주의법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서울 선언 VI-84)라고 명시한다. 교회가 불의한 폭력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예언적 목소리를 내는 사명에 실패하는 것이다.
지난 200여 년간 개신교 선교 활동이 이어졌지만,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의 세계 종교권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10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적 선언은 여전히 타 종교인들을 복음 변혁을 위한 협력자나 주체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교회가 배우지 않는 한, 부족과 국가 간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복음 수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교 신학의 초점을 ‘우리 대 그들(us vs. them)’이라는 영토적 개념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혼합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타 종교권의 영적 열망을 고려한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충분히 탐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종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상호 변혁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11
단순한 문화적 상황화를 넘어, 타 종교 신자들과의 본격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볼 때, 서울 선언의 취약점 중 하나는 미래 선교 전략과 관련된 ‘종교 신학’에 대한 논의의 부족일 것이다.
비록 종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타협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들을 기독교의 적이나 박해자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기독교 선교는 여전히 그들을 단순한 개종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활동으로 보일 것이다.
살아 있는 신앙 간에 깊은 우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회는 여전히 신학적으로 부족 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로부터 ‘공통된 인간성(common personhood)’이라는 선물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12
또 하나의 누락된 부분은 대회 초반에 서울 선언이 발표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전 대회들과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신학위원회가 제시한 서울 선언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대표단이 논의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세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중심적 세상 속 협업의 재형성
기독교 선교의 미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질에 달려 있다. 이는 서구권에서의 선교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서구 선교 단체와 연합체들은 서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며, 리더십 문화와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13 그러나 다수 세계의 선교 운동이 겸손, 정직, 섬김의 리더십 없이 기존의 식민적 선교 패러다임을 답습한다면, 깊은 영향력과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많은 다수세계 선교 지도자들은 ‘협업’이라는 명목이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영향력 있는 플랫폼과 의사 결정 권한이 여전히 재정을 지원하는 측에 머물러 있다면, 협업 요청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누구의 협업이며, 누구의 우선순위가 다중심적(polycentric) 세계에서 선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인가?
Endnotes
-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Lausanne Movement,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lausanne.org/ko/report.
- ‘The Seoul Statement,’ Lausanne Movement,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lausanne.org/ko/statement/%ec%84%9c%ec%9a%b8-%ec%84%a0%ec%96%b8.
- 서울 선언은 신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는 더 큰 전략적 협업 행동이 필요한 영역을 강조한다. 서울 선언은 로잔언약(1974), 마닐라 선언(1989), 케이프타운 서약(2010)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The Lausanne Covenant,’ Lausanne Movement,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lausanne.org/ko/statement/lausanne-covenant-ko.
- ‘The Manila Manifesto,’ Lausanne Movement,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lausanne.org/ko/statement/manila-manifesto-ko.
- ‘The Cape Town Commitment,’ Lausanne Movement,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lausanne.org/ko/statement/ctcommitment-ko.
- 로잔의 신학적 문서들은 종종 선교적 사고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된다. 참고문헌: See Robert Schreiter, ‘From Lausanne Covenant to the Cape Town Commitment: A Theological Assessmen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35, no. 2 (April 2011): 88-91.
- See ‘The Seoul Statement,’ Section I-16.
- 교회론에 대한 집중이 중요하지만, 선교의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전반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선교적 교회 운동(missional church movement)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를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가진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참고 자료: See Rolf Kjøde, ‘Participant Perspective: Building on a firm foundation,’ Vista, December 14, 2024, https://vistajournal.online/latest-articles/ij1bn5hp85097yjohjeesh6k3rchkm.
- See Terry Muck and Frances Adeney, Christianity Encountering with World Religion (Encountering Mission): The Practice of Miss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Michigan: Baker Academic, 2009).
- 복음주의자들은 삼위일체적 신학 틀 안에서 타종교 신자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복음주의를 기존의 협소한 경계(parochial boundaries) 너머로 확장하려고 한다. 이들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며 더 깊이 있는 관계 형성과 상호 대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See Gerald McDermott and Harold Netland, A Trinitarian Theology of Religions: An Evangelical Propos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Kang-San Tan, ‘Crossing Religious and Cultural Frontiers: Rethinking Mission as Inreligionisation,’ IJFM 39:2-4, Summer-Winter 2022:69-75, IJFM_39_2_4-Tan-Crossing-Frontiers-and-Response.pdf.
- 비록 서울 선언에서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개념은 대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를 다루는 실무 그룹도 운영되었다.

